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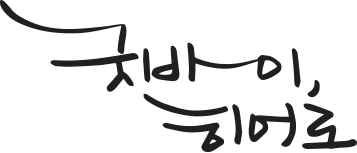


1991년 돌풍을 일으킨 '중학생' 이규혁의 모습을 담기 위해 모여든 취재진. 이인숙씨 제공

1992년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한·일 주니어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대회에 출전한 이규혁. 그는 이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따낸다. 이인숙씨 제공

피겨스케이팅 코치였던 어머니 이인숙씨를 따라 연습장에 나선 이규혁 (왼쪽,당시 4세) 스케이트를 신고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규혁 (오른쪽,당시 5세). 표정은 짓궂지만 자세는 진지하다. 이인숙씨 제공

이규혁·규현 형제. 이인숙씨 제공
막폼으로 1등한 4학년 규혁이
“네? 규혁이가 1등을 했다고요?”
뜻밖의 전화였다. 규혁은 롤러스케이트도 없다. 스케이트를 제대로 배운 적도 없다. 그런데 규혁이 우승을 했단다. 6학년 형들까지 제치고 ‘코흘리개’ 4학년이. 매년 열리는 리라국민학교 롤러스케이트 전교 챔피언 대회가 있었나보다. 더위가 막 느껴지기 시작했던 1988년 여름의 초입이었다.
규혁의 어머니 이인숙씨는 당시 여자피겨 국가대표 코치였다. 일은 늘 고됐다. 뜻밖의 전화를 받은 날은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었다. 얼떨떨해하며 주섬주섬 옷을 챙겨입고 학교로 갔다. 전교챔피언이 된 아이의 엄마가 그날 밥을 사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의문은 이내 풀렸다. 롤러스케이트는 선생님이 친구 것을 빌려 규혁에게 신게 했다. 규혁은 남의 스케이트를 자기 것인양 신고 쭉쭉 앞으로 치고나갔다.
‘다크호스’ 규혁의 등장은 또래 어머니들에게 충격이었던 듯했다. 자신의 아이가 전교 챔피언이 될 줄 알고 미리 나와서 한 턱 쏠 준비를 하고 있던 터이니 그럴만도 했다. 다른 엄마들의 얼굴을 보기가 조금 미안했다. 빙상장이 아닌 롤러스케이트장에서, 규혁은 그렇게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했다.
그해 겨울, 규혁은 타고난 끼를 한껏 드러냈다. 태릉 야외 스케이트장에서 열린 교내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것이다. 자세도 모르는 ‘애송이’가 그냥 스케이트를 신고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막폼으로 얼음을 마구 지쳤다. 하지만 규혁을 따라잡는 아이는 없었다. 간혹 규혁은 달음박질을 하다 멈춰서서 혹 누가 바짝 따라오고 있지는 않은지 보려고 뒤를 살폈다. 그렇게 가다쉬다를 반복해도 제일 빨랐다. 구경하던 부모들의 부러운 듯한 웃음과 감탄이 뒤섞였다.
코치 선생님은 규혁의 입문을 권유했다. 애가 소질이 있으니 본격적으로 스케이트를 시켜보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망설임은 없었다. 그렇게 규혁의 긴 선수 생활이 시작됐다.

초등학교 시절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이규혁. 이인숙씨 제공
‘모태 스케이터’ 이규혁
막폼으로도 1등한 규혁의 재능은 타고난 것이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규혁의 부모 이익환·이인숙씨도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규혁의 아버지 이익환씨는 1960년대 대표적인 중·장거리 스피드 스케이터였다. 1968년 그르노블 동계올림픽에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로도 출전했다. 규혁의 어머니 이인숙씨도 국가대표를 지낸 ‘여자 피겨 1세대’다. 김연아를 키워낸 류종현, 해설가 방상아, 국제심판 고성희가 이씨의 제자들이다.

1988년 전국체전 초등부 예선 경기 모습. 이인숙씨 제공
규혁은 ‘모태 스케이터’였다. 규혁의 어머니는 그를 뱃속에 품고서도 스케이트화를 놓지 않았다. 1978년 2월,규혁이를 낳기 1주일 전까지 스케이트를 탔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규혁은 어머니의 몸을 빙상 삼아 발길질을 해댔는지도 모른다.
규혁이 세상에 나와 처음 스케이트화를 신은 건 4살 때였다. 어머니로부터 조기교육을 받은 건 아니었다. 어머니 이인숙씨는 하루에 9~10시간씩 아이들을 가르쳐야 했다. 어린 규혁도 챙겨야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 논두렁을 얼려 만든 스케이트장에 그냥 규혁이를 풀어놓았다. 규혁에겐 얼음터가 놀이터였다.
규혁의 어머니가 꼭 스케이트를 시켜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다. 규혁에게 빙상인의 피가 흐르는 것을 의식하며 살지도 않았다. 초등학교 4학년 규혁의 ‘데뷔’는 우연을 가장한 운명처럼 찾아온 것이다.
규혁뿐만 아니라 두살 터울 동생 규현도 빙상인의 길을 가게 된다. 규현도 원래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였다. 규혁이 6학년, 규현이 4학년 때였다. 교내 대회에서 규혁이 1등, 규현이 2등을 했다. 규현이 형한테 치일까 마음이 쓰였다. 어머니는 두 아이의 갈 길을 정리했다. 규현한테는 피겨로 진로를 바꾸자고 권유했다. 스피드 스케이트에선 규혁을 쫓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규현도 남자 피겨 국가대표로 선발돼 규혁과 함께 1998년 나가노 올림픽과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에 출전한다.

1991년 경기 모습. 이인숙씨 제공
규혁이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면서 뒷바라지는 외할머니 몫이었다. 보문동 집에서 태릉까지 새벽 6시부터 규혁을 데리고 다니셨다. 식사 챙겨주는 것도 외할머니가 나섰다. 훈련을 다녀오면 규혁은 외할머니부터 찾았다.
어릴 때부터 규혁은 쿨했다. 고민을 가슴에 오래 담아두지 않는다. 본인이 계획하고 결정하고 실천한다. 살갑고 정이 많다. 규혁의 이런 성격은 규혁이 넘어져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에너지였다.
5살 많은 대학생의 경쟁자가 되다
타고난 재능과 체계적인 훈련으로 규혁의 잠재력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1989년 겨울 전국체전에서 국민학교부 우승을 시작으로 실력이 가파르게 향상됐다. 500m·1000m 단거리부터 1500m·3000m 중장거리까지 가리지 않고 출전하며 주니어 대회를 휩쓸었다. 그리고 1991년 12월 열린 국제대회 주니어 대표 선발전 남자 3000m에서 4분23초98을 기록하며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중학교 1학년생이 간판선수로 부상하던 대학생 형 김윤만을 제친 것이다.
당시 단거리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은 김윤만과 제갈성렬이었다. 두 사람의 경쟁구도 속에 까까머리 중학생이 뛰어들었다. 언론은 이영하-배기태의 계보를 이을 대형신인이 등장했다며 열광했다. 이듬해 규혁은 아시아컵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 파견선수 선발전에서 성인선수들과 겨뤄 1500m와 5000m에서 모두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중3 때인 1993년부터는 학생 꼬리표를 떼고 시니어 대회에 출전했다. 그해 열린 전국 스프린트 대회에서도 김윤만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5살이나 위인 김윤만의 당당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했다. 그해 김윤만은 알베르빌 올림픽 1000m에서 은메달을 땄다. 대한민국 스피드 스케이팅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이었다.
규혁은 1992년 알베르빌 올림픽이 끝난 뒤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당시 주장이었던 제갈성렬 국제심판은 그때의 규혁을 “자신감이 넘치는 또래와 다른 모습이었다”고 기억했다.

대한민국 남자 스피드 스케이트의 황금계보 1995년 12월17일 태릉에서 열린 아시아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권대회 남자 1500m를 석권한 김윤만(금·가운데), 제갈성렬(은·왼쪽), 이규혁(동·오른쪽). 고등학생 이규혁은 전날 열린 남자 10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인숙씨 제공
